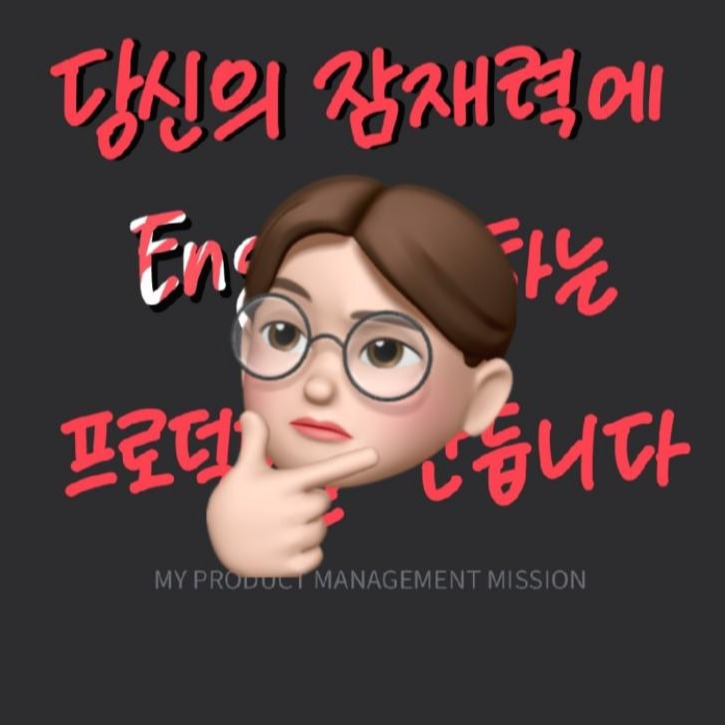어제에 이어 유저 리서치(포괄적으로는 시장 조사)에 대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알베르토 사보이아의 책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입니다.
이 책은 프리토타입 pretotype이라는 개념을 프로덕트 월드에 처음으로 소개했지만, 오늘의 쟁점은 프리토타입이 아닙니다. 오늘의 쟁점은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충분히 노련하고 시장에서 굴러본 사람이라면, 아이디어를 성공시킨다는 착각. "왜 그렇게 많은 노련한 사업가, PM,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애초에 안 통할 아이디어에 시간과 능력과 돈을 낭비할까?"
"어, 너 이 제품/앱/서비스 써봤어? 그럼 지금 시간 돼? 나랑 잠깐 인터뷰 좀 하자." 기획자라면 친구랑 이야기하다 생성형 인터뷰를 '급조'해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얼렁뚱땅 인터뷰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진행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에도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FGI의 결함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아이디어 전달 문제
2. 예측력 문제
3. 적극적 투자가 없다는 문제
4. 확증 편향 문제
1. 기획자의 머릿속에 있는 제품/서비스의 아이디어가 인터뷰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제품/서비스의 경우 더욱.
2. 인터뷰 대상 자신도 해당 제품/서비스를 좋아할지, 얼마나 쓸지, 주변 지인에게 추천할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제품이 나와서 6개월 정도 써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3. 인터뷰 대상자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흥하든, 망하든 어떤 손해도 입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와, 이 제품 정말 혁신적이네요, 나오면 꼭 다운로드/구매/구독 할게요!'라고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4. 앞의 3가지 문제를 극복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해도, 정성적 데이터를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되도록 내 아이디어에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고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량적 데이터가 줄 수 없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편으로는 소비자 스스로도 '예측력 문제' 즉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인터뷰에서 잠재된 니즈를 포착하는 게 PM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FGI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스킬, 시장에 대한 통찰, 경험과 상관 없이 FGI 만으로는 '애초에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려낼 수 없다고요. 위의 4가지 결함이 치명적인 이유는 기획자를 '생각랜드', 즉 주관에 가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각랜드'는 '바람직한' '있음직한' 세계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실제 시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통하는 아이디어와 통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있을 뿐이지요. 이건 저자가 겪은 처참한 사업 실패와 다른 유망한 유니콘들의 추락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이 통찰이 오늘의 저에게 날카로웠던 이유는 '생각랜드'에 머무르는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릇이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품을 팔아 시장으로 뛰쳐나가는 것보다 '생각랜드'에 머무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될 법한 아이디어를 엮어서 적당히 호응해주는 인터뷰 대상을 찾고 잘 버무리면 그럴듯해 보이겠지? 아무래도 조별과제를 너무 많이 해서 나쁜 버릇이 들었나 봅니다.
새로운 프로덕트의 탄생을 위해서 인터뷰가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생각랜드에서도 빠르게 빠져나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소개했듯 이 책은 프리토타입을 최초로 소개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프리토타입을 해결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제 아티클 역시 프리토타입에 대한 글이 될까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기획하는 유저 인터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주니어 PM이 들려주는 아티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M 준비생이 들려주는 아티클] 유저리서치는 시간낭비다? (0) | 2022.10.01 |
|---|